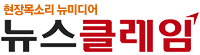일제의 ‘강제징용’은 악랄했다. 아예 ‘군대식’이었다. 하루에 3번씩 점호를 받아야 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작업에 들어갈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점호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탄광의 갱 안으로 들어갈 때는 “○○분대 분대장 이하 ○○명, 오늘의 목표 ○○톤”이라고 외치도록 했다. 목표량을 채울 때까지는 갱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게다가 ‘증산운동’도 잦았다. 그러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조선 노동자들은 하루 12∼13시간씩이나 작업을 해야 했다. 공휴일도 예외가 없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했다. 1944년 1월, 미쓰비시 비바이 탄광에서는 106명의 ‘채탄결사대’가 결성되었다. 감독관은 이렇게 훈시하고 있었다.
“쓰러져도 다시금 파나가는 ‘자폭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 훌륭하게 죽을 각오로 몸을 바치기 바란다.”
‘가미카제 특공대’를 만들기도 했다. ‘가미카제’라는 글이 적힌 완장을 차고, “육신이 죽어도 절대 탄광을 사수하고,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하도록 한 것이다.
홋카이도의 어떤 비행장 건설공사에서는 책임자인 ‘하사관’ 밑에 조선 사람이 20명씩 한 반을 구성, 군대식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하루 15∼16시간의 노동시간에서 휴식은 고작 30분 정도였다. 휴일은 당연히 없었고, 비가 쏟아져도 일을 하도록 했다.
작업 중에는 감시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보통 하루에 50번 이상 맞아야 했다. 일이 끝나서 숙소로 돌아올 때는 ‘군가와 행진곡’을 부르도록 했다. <빼앗긴 조국 끌려가는 사람들, 한일문제연구원>
조선 사람들은 끔찍한 징용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성병에 감염되거나 멀쩡한 팔다리를 망가뜨리는 ‘자해행위’를 하기도 했다. 죽창과 낫 등으로 무장하고 저항하기도 했다.
끌려가서는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자 일제는 합숙소의 창에 창살을 설치하고 출입문은 밖에서 잠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방울을 달고, 개까지 풀어서 지키기도 했다. ‘탈출 방지용’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서만 혹사당한 게 아니었다. 국내에서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일제는 이른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된 1938년 4월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국내 6956개 장소에서 온갖 작업장을 운영했다. 평안북도 877개, 함경남도 657개,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712개, 강원도 661개 등이었다. 그 기간 동안 강제 동원된 조선 사람은 '연인원' 648만8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강제노역장은 그 이전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냈다는 소식이다. ‘역사전쟁 팀’이라는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고 한다. 양국 관계는 또 껄끄러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국내의 강제징용 현장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 어떨까. 일본의 ‘ 과거사’를 세계에 다시 알려서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