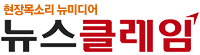故김용균씨 장례식 62일만에 민주사회장으로 거행
어머니 김미숙씨 "아들 죽음 이용해서라도 더 이상 노동자 죽는 일 없어야"

“용균이는 떠났지만 앞으로 남은 비정규직제가 정규직화 되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故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자식을 보내던 날 노동자들 앞에 다시 섰다. 이미 많이 부운 눈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심정을 그대로 들어낸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 김 씨의 음성은 평소보다 더 떨렸다. 흐느껴 울기를 수차례 후 따라 우는 이들을 달래며 “이제 우리 용균이 보내자. 금 쪽 같은 자식을 이만 보내겠다”고 다짐의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 “더 이상 노동환경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외쳤다. 다음은 김미숙 어머니의 단상 연설 중 일부다.

“남들(일부 네티즌과 보수집단)은 노동계가 우리 용균이를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올려보자는 취지라고 비꼬고 있어요. 저도 들리는 말들이 있어 귀로 듣고 알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비정규직들이 죽어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죽은 우리 아이를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건 경제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라서 죽어도 되고 정규직이라서 살아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다 같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숨이 담보됐으면 바람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는데 과연 이게 생떼인가요?”
김 씨 어머니의 짧은 몇 마디는 장례를 치르기 전 62일 동안의 설움이 그대로 묻어났다. 그리고 날카로웠다.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다. 목숨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울림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이 같은 울림에 장례식 참가 노동자들은 일순간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며 더 이상 노동자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소망했다.

한편 9일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의 장례식이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이 목숨을 잃은 지 62일만이다.
장례에는 각 산업체 노동자들과 세월호, 삼성백혈병 유가족 등 산재?재난?피해 유가족 등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며 한손에는 “김용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들고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염원이었던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갈 것을 다짐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고인이 목숨을 잃은 일터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 앞에서 노제를 열였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방향으로 1km 가량 도보로 이동하며 운구행렬을 이었다.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지회장은 “고인이 된 용균이가 바라던 소망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례 절차는 오후 5시 30분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하관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용균 노동자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원칙과 달리 혼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죽음의 외주화’를 일깨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