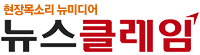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단순한 숫자의 삭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유의미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클레임>은 장애인들이 인식하는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속사정을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획기사 연재 순서
1.그들의 불편한 몸부림
2.장애 삶 변화 있어야 문제는 ‘예산’
3.장애인들 혜택 특권? 따가운 시선들

지난해 연말, 세계 인권의 날에 장애인들이 성공회 대성당에서 집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장애인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선 예산증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장애인들은 성공회 대성당 초입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들이 기념식이 열리는 성공회 성당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외 투쟁을 진행했다. 여차하면 경찰벽을 뚫고 기념식장으로 난입할 계획도 짰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이들이 휠체어를 무기삼아 할 수 있는 건 차디찬 바닥에 드러눕는 게 전부였다. 경찰들은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진 장애인들을 들어 차도로 내던졌다. 이런 투쟁은 기념식이 끝날 때까지도 이어졌다.
이를 지켜본 비장애인들은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갔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꺼리도 예사였다.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투쟁은 그저 생떼처럼 비쳐졌다.
장애가 있으니 비장애인들보다 더 보살핌을 받는 건 당연한데, 비장애인들은 그걸 장애인들의 특권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의 시위집회에서 늘 상 볼 수 있는 일이다.
사실 비장애인들이 시비나 걸지 않으면 다행이다.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불합리한 것에 목소리를 내지 마란 법도 없는데 비장애인들은 그걸 눈꼴시려한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라는 자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스럼없이 한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은 그저 육두문자 속 내용이 전부다. 그러니 일상에서도 툭하면 "장애인처럼 왜 그러냐? 성격이 장애인이냐"는 등의 비하 발언은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이도 별로 없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 대하는 현실이 그렇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 눈치 보인다고 말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당연히 보장 받고 보호 받을 권리인데 말이다. 비장애인들의 따가운 시선은 장애인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했다. 장애인들의 집회 시위가 과격해진 이유다.
어떤 식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은 열망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더 과격해지고 과감해져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쇠사슬 행진이 그것이다. 간혹 장애인들 집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쇠사슬이다. 장애인들은 쇠사슬로 각자 몸을 묶은 다음 그걸 잇는다. 그렇게 되면 넘어지게나 경찰 손에 들려 나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불편한 몸이니, 제대로된 저항은 꿈도 못꾼다. 여차하면 들려 나가길 수십차례. 쇠사슬을 몸을 묶은 후부터는 경찰도 어찌 할 수 없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사실 시위 집회 과정에서도 우리는 소외 받는 느낌이다"라며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