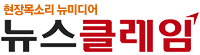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현재 소주·맥주 등의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정부가 술에 먹이는 세금 부과 방식을 개편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소비자들과 맥주업계 간 온도차가 심해서다. 국산맥주는 수입맥주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4캔에 1만원에 팔지만, 국산맥주는 그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가심비(싼 가격에도 만족감은 높은 소비트렌드) 높은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오비맥주와 하이트의 매출 대비 주세율은 44%였던 반면 하이네켄코리아와 칭따오는 각각 16%, 28%에 불과했다. 세금 차이로 2012년 4.9%였던 수입맥주 점유율은 지금은 20% 이상으로 높아졌다. 편의점에서는 수입맥주 점유율이 56%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이트는 맥주 공장 3개 중 하나를 닫고 소주 공장으로 돌리고 있다”며 “약 7조9000억원 규모의 맥주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금을 통한 술 가격 절충이 쉽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작용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홍 부총리가 말한 주세법 개편안이 나오는 4월이 코앞이다. 맥주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0년 만에 종가세(從價稅)에서 종량세(從量稅)로 바꾸는 주세 개편안이 독일지 약일지 주판알을 튕겨보기도 한다. 만약 종량세로 개편이 된다면 국산맥주업계에는 구원투수가 등판하는 셈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사상 최대인 2억6309만달러(약 2807억원)를 돌파했다. 국산 맥주는 원재료비에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해 세금(72%)을 매긴다. 원가에 이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남길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맥주 출고가격이 정해지면 유통 과정에서 그 가격 이하로 내리는 것은 어렵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회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비례한 관세(0~30%)를 붙인 금액을 원가로 해 주세(72%)를 매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원재료비와 상관없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유통 수수료도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존 종가세의 룰(rule)이었다.
이 룰이 개편 되는 게 종량세다. 술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가 아닌 ‘술의 용량’ 또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얼핏 봐도 용량과 도수에 세금을 먹이면 소주 가격은 오르고, 수입맥주 4캔=1만원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서민술과 가심비 좋은 술의 가격이 올라가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주세 개편이 오히려 다양했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꼴이다. 가격도 개편 전과 달리 더 비싸질 개연성도 커졌다. 그간 정부가 주세개편안을 쉽게 손대지 못했던 이유다. 다행인 건 정부가 기존 가격이 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세법을 개편한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번 주세개편안에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오비맥주는 카스 가격을 올렸다. 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 수입맥주 때문에 떨어진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도미노 현상을 보인다. 롯데주류도 클라우드의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7~8%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