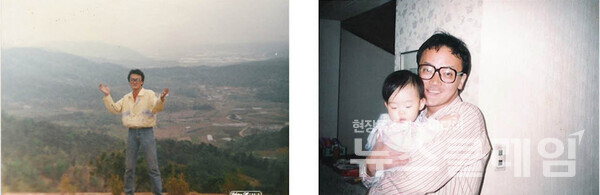[뉴스클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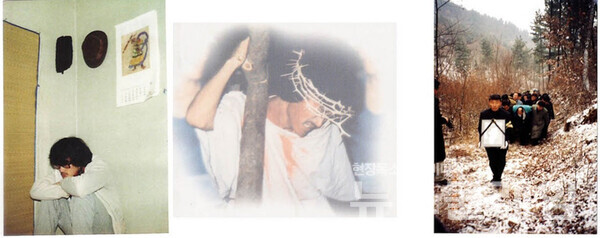
[뉴스클레임]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을 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 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가수 안치환이 불렀던 "민중의 아버지"다.
이 노래를 작곡했으며 도시빈민과 관련된 노래를 만든 '빈민의 벗 김흥겸' 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으로 이장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흥겸은 1980년대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기지개를 켤 무렵 신학과를 다녔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십자가를 둘러메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최루탄이 난무하던 학교 정문을 향해 걸으며 저항의 몸짓을 보여주던 모습이다. 그는 학교를 떠나 80년대와 90년대 빈민 운동의 최일선에서 철거민 및 노점상들과 투쟁을 함께 했다. 그의 활동은 엄혹한 시절 ‘서울시철거민협의회’를 조직하고 ‘전국노점상연합회’와 함께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하는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한국 전쟁 이후 사회가 경직되고 민주주의가 멈춰 있던 시절 오래전부터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가난한 곳의 아이와 일반인을 상대로 '야학(제도권 바깥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곳)'을 전개해 왔다. 김흥겸이 참석한 신림동 난곡의 ‘낙골 교회 "가 그랬다. 난곡은 1960년대 도심 불량 주택단지와 용산, 청계천, 서울역 등의 판자촌이 철거된 후 그곳에 살던 사람 사람들이 이주해 오자 구청에서 8평씩 분필로 금을 긋고 나눠주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난곡이란 명칭도 햇볕이 잘 들어 난초가 무성히 잘 자란다는 의미에서 생겼다는 설도 있고, 도심지에서 강제 철거된 집단 이주민들이 뼈가 굴러다니는 공동묘지에 정착하면서 쓰레기처럼 내던져진 자신들의 삶을 낙골落骨에 빗대면서 붙인 것이라는 설도 있다.
1984년 나효우 전도사와 김흥겸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 낙골 교회공동체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예배가 한자리에 앉아서 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현장을 따라 움직이며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다른 지역의 야학이 대부분 검정고시나 노동 야학 위주로 진행됐던 데 반해, 낙골야학은 생활 야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신도들과 함께 교회 건물을 떠나 매주 집회 현장을 옮겨 다니고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이 가장 즐겨 부르던 노래는 단연 김흥겸 전도사가 작사 작곡한 '민중의 아버지', 그리고 당시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상록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었다.
김기돈의 ‘낙골교회 이십 년 역사 읽기’에 따르면 “어떤 날은 다른 순서 없이 이러한 노래를 돌아가면서 한 곡씩 부르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했다"고 한다. "낙골의 노래는 삶이며, 생활 같은 것이었다. 평일에도 장구와 징으로 장단을 맞추며 목청껏 노래를 불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마음소통을 이뤘다.” 라고 전한다. 이들은 난곡을 벗어나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당동과 상계동, 양평동등 철거투쟁 현장에 합류하기도 했고,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위 도중에 다친 노동자들을 병문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운동이 그랬지만 엄혹한 시절 종교인의 양심적인 활동은 커다란 힘이자 위안이었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현재까지직간접 적으로 이어진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화재가 난 남일당 건물 앞에서 마지막까지 현장예배가 개최된다. 최근에도 젊은 종교인들의 모임인 ‘옥바라지선교센터’ 를 중심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을 둘러싼 투쟁 현장에서의 현장 예배와 이밖에도 을지 OB 베어 현장 그리고 장위동, 명동 재개발 지역 등에서 면면히 연대가 계승되고 있다. 오래전 김흥겸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둘러메고 부조리한 사회에 맞섰던 것처럼 이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