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7% 위기…청년들 "합격 아닌 생존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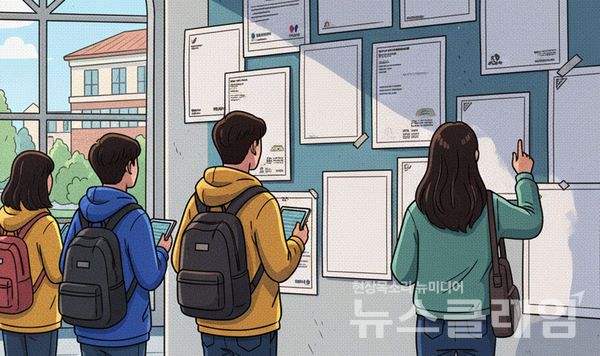
[뉴스클레임]
경기 침체 여파로 청년 실업률이 7%에 달하면서, 매번 '합격'을 기다리는 취업준비생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취업을 향한 간절함 위로 경력직 중심의 채용 시장, 수시 채용 확산, 높은 경쟁률이 현실의 벽을 높이고 있다. 입사지원에 반복 탈락이 이어지자 구직 현장 곳곳에서는 불안, 체념, 새로운 도전과 포기가 복잡하게 교차한다.
구직자 박수민(28) 씨는 올해만 이력서를 20장 넘게 썼다. 서류를 통과해도 면접에서 매번 발길을 돌린다. 그는 “지원할 때마다 경력직 우대, 수시채용 전환 등 신입 자리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 마음도 몸도 다 지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취업컨설팅 현장에서도 “이력서·자소서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뽑는 숫자 자체가 줄었다”는 분위기다. 한 상담사는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고, 취업에 성공해도 대부분 계약직·기간제다. 시스템이 너무 빠르게 바뀐다”며 말했다.
상반기 기준 청년 실업률은 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약 375만명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다. 반복 탈락에 지친 구직자들은 저마다 "이젠 해외취업도 진지하게 고민 중”, “올해는 아예 공무원 시험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토로했다. 이지연(25) 씨는 “면접 한 번 잡히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합격자 발표 날이 오히려 두려워진다”고 말했다.
구직난의 이면엔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수시채용 확대, 경력 위주 뽑기로 전략을 바꿨다. 한 대형 공공기관 인사팀 관계자는 “최근 신입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이나 IT·바이오 등 직무공백을 메우는 특채가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대졸·고졸자별 취업 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대, 고졸 신입 채용 창구는 더 협소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채용시장 성공 사례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높아진 합격 문턱과 연이은 탈락 경험은 구직 소진과 번아웃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은 43.1%, 지난 10년간은 11.1%p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또한 174만8000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신규 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안정 정책, 직무경험 기회 확대, 청년 맞춤 컨설팅 등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고용률 상승만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고용 분석 전문가는 “청년 고용 위기는 한 세대의 미래와 국가의 성장 동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신호”라면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질적 고용 혁신과 사회안전망 보강,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 같은 실효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