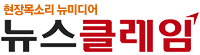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장애인이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장사 안 해요. 그런데 비장애인이 음식점에 들어오면 아주 반갑게 맞아 줍니다. 이게 바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수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차별을 금지해 달라고 외친다. 법이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장애인들의 인권은 이미 죽어 묻드러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1일 오전11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생활편의시설 이용 접근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과 커피숍도 장애인에게는 접근불가의 시설"이라며 "현재 장애인 등 편의법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상점에 한해서만 장애인 편의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누구나 이용가능해야 할 생활편의시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일반 식당에 가더라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김명학 노들야학 활동가는 "화가 난다. 답답하다. 함께 가는 사회를 외치지만 그 누구도 장애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기 싫어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에 무관심한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벅찰 때가 많다"고 울먹였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이동권 자체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기 보다는 권고 사항에 그쳐 있기 때문이다. 권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에 2019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강력한 정책권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영상 촬영=박혜진 기자
영상 편집=김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