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랑길27코스 죽변항-울진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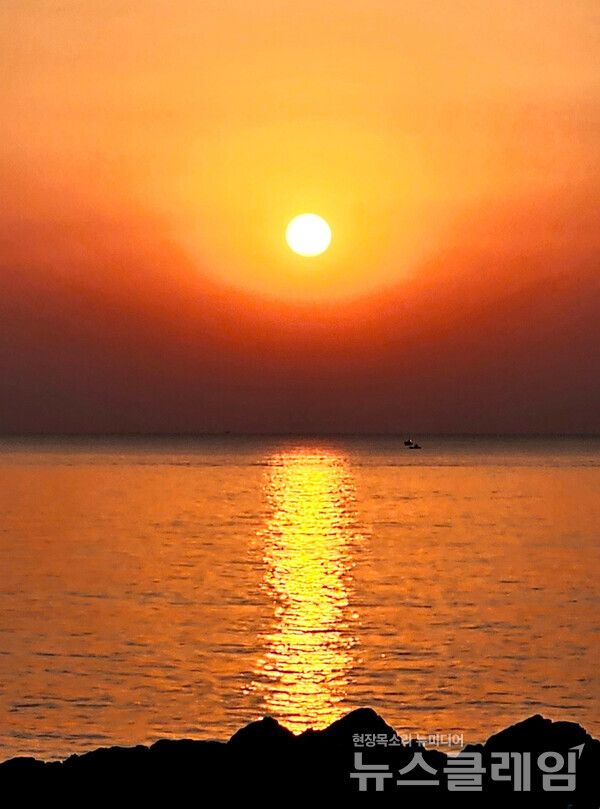
[뉴스클레임]
해파랑길27코스는 죽변항을 한 바퀴 돌아 바다를 떠나 원자력발전소의 배후 지원도시로 변하고 있는 울진군 북면의 부두 삼거리까지 11.5km의 비교적 짧은 길이다. 험하거나 위험한 구간도 없으니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이번 일정은 코스의 끝 지점에 차를 놓고 죽변항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가 걸어오기로 했다. 아내가 뇌동맥류 출혈에서 회복 후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체력적으로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11.5km의 평지길 걷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500여 년의 긴 세월을 견디고 마을의 수호신이 된 향나무를 다시 보고 죽변항으로 들어갔다. 항구가 꽤 크다. 매우 한산하다. 사람 보기 어렵다. 허름한 집 앞에 물고기 몇 마리가 바람에 마르고 있을 뿐이다. 항구 북쪽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많은 양의 생선이 들어오고 나가며 너도나도 신바람 났던 옛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엄습하고 있던 시절 잠시 지나가며 본 장면이 죽변항의 본 모습은 아니겠지만 알음알음 들었던 모습은 아니었다.

죽변항 북쪽 끝에는 어시장과 식당들이 제법 보였다. 관광버스도 몇 대 서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단체관광 인솔자가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죽변항 북쪽 바닷가를 따라 설치된 관광용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탑승시간이 된 듯했다. 1.4km의 이 시설은 해안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되어 있어서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에 앉아 약 40분간 해안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길은 언덕 위 죽변등대공원으로 오르고 곧 저 아래 뻗어 있는 레일 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이 보였다. 바닷가 경치는 크고 작은 바위와 그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가 만들어 내는 물거품의 어울림이 다인데, 죽변의 해안 경치에는 인공 시설물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20여 년 전의 어느 드라마를 촬영했던 집은 비어 있는 듯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드라마다.

늦은 시간에 걷기를 시작한 탓에 등대공원에서 내려오니 어느새 점심시간이었다. 죽변항 배후의 거리에서 문을 연 식당은 찾기 어려웠다. 여행하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점심 식사 후 나선 길은 보리밭을 지나고, 진달래가 활짝 핀 작은 산을 지나고, 아스팔트 포장된 드넓은 공터를 지났다.
마을로 내려서기 전 마주 오는 이를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배낭을 메고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으니 틀림없이 해파랑길을 걷는 이다. 그는 우리가 가고 있는 고성의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갈아입을 여분의 옷만 배낭에 넣고 며칠째 계속 걷고 있었다. 하루 한 코스를 걸어 50일에 다 걸어 낼 계획이었는데 열흘은 더 걸릴 듯하다며, 건강하게 걸으라는 말을 남기고 부지런히 걸어 나갔다.

불탄 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등걸이 까맣게 변한 나무들을 베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1년 전인 2022년 봄에 뉴스로 접했던 울진 지역의 대규모 산불이 기억났다. 가까운 산의 모습은 처참했다. 성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불탄 산 정리하고 다시 나무를 심고, 아직 살아남은 땅속 나무뿌리에서 새순이 돋고 풀이 자라 다시 숲이 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듯했다.

길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근사한 한옥이 한 채 보였다. 죽변항을 출발한 지 4시간 가까이 지났다. 걸은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싫은 기색이 역력한 아내를 설득해 잠시 코스를 벗어나 서너 채의 집을 지나 가까이 다가갔다.
헐벗은 한옥이었다. 단순히 주거용 집의 모습은 아닌 듯했다. 기와는 곧 허물어질 듯하고 창문에 문종이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툇마루 아래엔 농사용 자재 포대가 아무렇게나 포개어져 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문 옆 기둥엔 종이에 써서 붙인 주련이 서넛 보였다. 주인이 힘겹게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랑채처럼 보이는 건물 처마 아래 편액이 둘 걸려 있었다. 그 하나엔 해서로 陶邨(도촌)이라 새겨져 있었다. 왼쪽에 이 글씨 쓴 이를 나타내는 米源榮印(미원영인)이 작게 새겨져 있다. 다른 편액에는 심하게 흘려 쓰지 않은 행서, 竹坡(죽파)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를 쓴 이는 紫雲(자운)이었다. ‘도촌’과 ‘죽파’ 그리고 이 글씨를 쓴 ‘미원영’이라는 인물과 ‘자운’을 호로 썼던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허물어져 가면서도 힘겹게 위엄을 지키고 있던 이 집의 사연도 알아내지 못했다.
다만, 스러지지 말고, 잘 보존되어 글씨의 사연과 쓴 이들에 관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 생활하며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성 씨인 미(米) 씨 가문의 이야기도 전해지기를...
글쓴이 오근식=1958년에 태어나 철도청 공무원, 인제대학교백병원 그리고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일했다. 2019년 2월 정년퇴직하고, 제주 올레, 고창과 통영의 길과 섬을 걸었다. 이후 해파랑길 750km를 걷기 여행을 마치고 현재는 1,470km의 남파랑길을 걷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