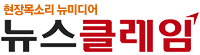삼청동에는 매달 살롱음악회가 열린다

[뉴스클레임]
케케묵은 사진첩을 열어젖혔다. 흑백 사진들을 훑어보다가 나는 한 장의 사진을 집어 들었다. 지난여름 타슈켄트거리에서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다.
타슈켄트 고가도로 위를 되돌아가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들었다. 한참을 걷고서야 비로소 정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고가도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수온 주는 50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목덜미를 사정없이 내리찍는 작열하는 태양을 지긋이 바라보았다. 나는 한마디 신음도 없이 묵묵히 걸었다.
고가도로를 내려와 도심지로 접어들었다. 어느 순간 싸늘한 한기를 느꼈다. 이 무더운 날에 한기(寒氣)라니,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시내를 나 홀로 걷고 있는 것이었다.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결에 도로를 나뒹구는 가로수 잎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안국역 1번 출구를 나와 삼청동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접어드는 순간, 내 눈앞에서는 믿기지 않은 광경이 나타났다. 들풀들과 들꽃들로 어우러진 평원이 널브러지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춤을 추며 꽃들 사이를 날고 있는 나비가 시야에 들어왔다. 실바람에도 강아지풀이 살랑거리고 있었다. 마치 시골 들녘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었다.
‘세상에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광경이라니….’
삼청동 라플란드 카페에 도착한 것은 7시를 조금 넘어서였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강아지풀을 넋 놓고 바라보다가 그만 시간을 놓친 것이다. 내가 클래식 음악회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부정적이었다. 피아노 연주회에 갔다가 곤욕을 치른 젊은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다.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클래식을 우아한 척 듣는 것은 고역이었다. 물론 훗날 클래식이 지루한 게 아니라 나의 클래식에 대한 몰이해가 지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의 주변에는 클래식 애호가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들의 클래식 사랑을 부러워했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을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지성을 질투했다. 이번 생애(生涯)에서는 질투는 질투로 끝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 나에게 클래식 연주회에 가 달라니!.
“음악회를 가셔야겠는데요.”
먼저 얘기할 것은 박정환 대표이다. 박 대표는 창원에 거점을 두고 전국을 돌면서 수십 년간 포스기 영업을 줄기차게 하시는 분이다. 남들이 한물갔다고 평가하는 포스 영업에서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사업가다.
박 대표는 고집을 부렸다.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내게 계속 음악회 참석을 강권했다. 이곳에 참석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못 이긴 척하고 박 대표의 협박을 받아들였다.
예수가 살아 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디사트바가 자신의 체험적인 지혜를 대중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처럼, 박 대표의 협박은 내게 고귀한 경험을 제공했다. 박 대표의 협박은 열정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풍부하게 만드는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분하게도(?) 그것은 살롱음악회가 끝난 이후에 말이다.
살롱음악회는 음악애호가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나처럼 클래식 무지렁이도 참석, 감명을 받을 수 있다. 연주를 듣는 내내 편안했다. 나는 그동안 음악을 물리적으로 듣기만 했다.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등에서 울려 퍼지는 미묘한 선율이 내 온몸을 파고들었다.
지난 7월의 살롱음악회가 그러했다. 두 번째로 참석한 살롱음악회 도중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내면에서 리듬이 흘러나왔다. 무엇이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리드미컬한 흥분에 나는 지배당했다. 음악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 꿈틀거리는 리듬은 한참 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그날, 뒷자리에서 연주를 들었던 것은 어쩌면 행운일지 모른다. 연주회의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직원의 예사롭지 않은 복장과 춤사위였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치마 복장에 연주에 맞춰, 그는 각기 다른 춤사위를 선보였다. 특히 사중주로 연주한 보헤미안 랩소디 연주에서 즉흥적인 춤사위는 절정을 달했다.
덩달아 나도 신명이 났다. 어느새 내 안으로 스며들어 간 리듬이 메마른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나 할까.
난 스스로 리듬과 함께 불타올랐다. 타슈켄트거리를 걷는 내 모습이 갑자기 확 들어왔다.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방인, 즉 낯선 사람의 뒷모습이다.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자의 뒷모습이다. 애써 잃어버리려고 한 고통스럽고 외로운 사진이었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소중한 것은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기억을 되살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나서는 것은 나의 외로운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들에게는 비록 비루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소중한 삶의 기억들이다.
시간은 기억과 기억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존재한다. 나는 기억과 시간 사이에서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핀셋으로 한 부분만 딱 집어서 끄집어내고, 대롱대롱 핀셋에 매달린 기억의 파편을 들여다보는 것은 끔찍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시간이었고 나의 삶이다. 삶은 수레바퀴처럼 반복된다고 한다. 수레바퀴를 돌고 돌리더라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다. 나의 여정에는 휴게소도 목적지도 없다.
다음날 나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도심 속 강아지풀을 찾았다. 전날 음악회를 재촉하던 내 발길을 잠시 동안 묶어놓은 안국역 인근 공원을 재차 방문한 것이다. 열정과 환상이 머무는 기억을 소환하기에는 그곳은 최적의 장소다.
나는 풀밭 위 긴 의자에 앉아 타슈켄트의 텅 빈 거리를 홀로 걷고 있는 흑백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 속의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은 또 다른 여정을 꿈꾸고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수없이 여정을 꾸려왔다. 나는 대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여정을 준비해야 하는가?
매달 셋째 수요일 저녁에는 라플란드 카페에서 살롱음악회가 열린다. 살롱음악회에서는 강소연 피아니스트 총괄 지휘 아래 매번 연주자가 바뀐다, 지난 7월에는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 연주가가 함께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앙코르곡의 주제는 망각(妄却)이었다. 사람들은 때로는 소중한 기억을 잃고 싶은 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