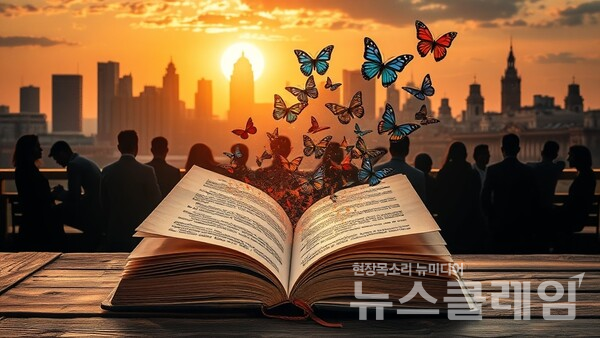
[뉴스클레임]
"우리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체제를 흔들었다." 어느 독일 시인의 말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체제가 예전에 깃발 위에 그려 놓은 유토피아를 사랑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 닿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체제를 흔들어댔지만 우리의 유토피아가 닿아 있던 나라를 결코 포기한 건 아니었다." - 동독의 시인 헬가 쾨니히스드로프
러시아는 혁명 후 사회주의리얼리즘 문학을 표명했다. 작가들에겐 창작의 기본 지침이자 교시인 셈이다. 고리키의 어머니가 이 사회주의리얼리즘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 이런 작품을 당과 국가에 부응하는 소련의 공식문학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않거나 사회주의 체제에 비판적인 작품은 공식적으로 출간되기 어려웠다. 이런 작품들을 비공식 문학이라고 불렀다.
혁명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국가는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전체 운명이 달린 격변기이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황을 막심 고리키는 이렇게 말했다.
"1917년에서 1921년 사이 나와 레닌과의 관계는 내가 바랐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정치가였다. 그는 꾸며 낸, 그러나 명확하게 다듬어 낸 흔들림 없는 정치적 견해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는 농민들이 납 덩어리처럼 가득 타고 있는 거대하고 무거운 러시아라는 배의 키를 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 블라미디르 레닌이 죽었다 중에서 / 가난한 사람들 막심 고리키 / 민음사
그러나 고리키를 비롯한 러시아 작가들은 이런 거대와 역사 앞에서도 제일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러시아 인민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혁명기의 혼란 속에서도 "인간이 진리" 임을 선언한 것이 러시아 작가들이다. 해서 그 통제와 억압 속에서 러시아 작가들이 문학으로 인민을 억압하는 체제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공산주의자였지만 스탈린체제를 정면에서 비판한 솔제니친은 우리에게 반공작가로 알려 있지만 정반대다. 그는 소련에서 추방되면서,
" 나는 언젠가는 소련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작가는 조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솔제니친은 실제로 돌아와서 정말 인민들과 같이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산다.
또, 혁명기에 삶을 뺏았긴 민중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 위해 작품을 쓴 '닥터 지바고'의 파스테르나크, 예브게니 자야틴과 미하일 불가코프, 그리고 사회주의를 향한 열망과 연민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20세기 최고의 산문 작가 플라토노프. 이런 작가들이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를 이어 받아 20세기 러시아 문학의 은세계를 이룩했다.
격동기에 체제에 반항하고, 자신들과 같은 세대를 힘겹게 살아간 민중에 대한 사랑이 러시아 문학을 세계에서 독보적인 예술로 만들어 냈다. 물론 그런 작가들의 삶은 모두 불행했다. 체제의 모든 억압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작가들은 짜르 체제, 혁명 후에도 결코 자신을 그 체제에 종속시키지 않았다. 사회주의리얼리즘 문학의 효시로 레닌에게 찬양 받았던 고리키도 그 중심은 인간, 즉 고통 받는 인민이었다. 그래서 레닌을 비판한 유일한 사람일 수 있었다.
문학을 하는 작가는 단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때 탄생한다. 단순히 글을 쓰는 재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시대적 요구(민중의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는)에 부응하는 것이 문학이고 예술이다.
그런 면에서 소비에트시대 러시아 작가들은 사회주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기본적으로 격동기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했다.
내가 러시아 문학을 말하는 것은 이것을 한국 문학이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또 내가 SNS에서 문학계와 민주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몇몇 시인이나 작가를 비판하면 반론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안 그런 작가도 있다...당신은 너무 일방적이고 결정론자 같이 글을 쓴다'는 말이다. 이 반론은 사실이다. 분명 안 그런 사람은 분명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수의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경향들을 있으니 바꾸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안 그런 사람도 있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러니 그런 경향들을 바꾸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