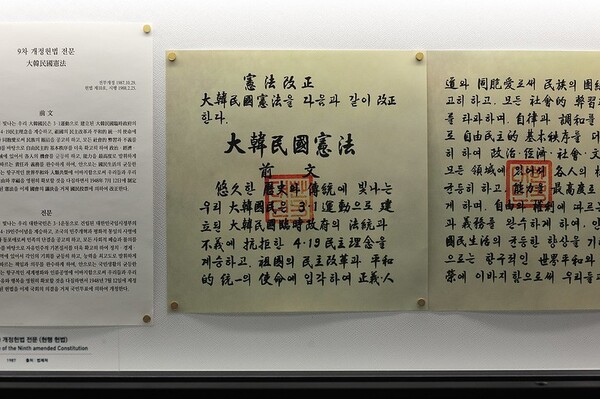
10년 전인 2012년, 정치판이 ‘헌법’ 때문에 요란했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논쟁이었다.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논쟁을 벌인 것이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경쟁’이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이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법론’도 서로 달랐다. 박 후보는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좋은 일자리 창출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이었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이었다.
‘반론’도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105명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치화’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경제의 사막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사막화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로 ▲잠재성장률 추락 ▲내수 여력 위축 ▲통화 유통속도 감소 ▲취업구조의 고령화 ▲취약한 기업생태계 ▲국가채무 급증 ▲반기업정서 확산 등을 꼽고 있었다.
이렇게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치화’, ‘경제사막화’로 정의되면서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먹고살기 바쁜데 헌법을 뒤져서 경제민주화를 연구해본 국민은 많지 않았을 것이었다. 뒤져봤더라도 ‘딱딱한 헌법’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쉬울 리가 없었다.
그나마 관심도 없었다.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들어는 봤다, 전혀 모른다”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64.3%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랬던 ‘헌법’이 10년 만에 또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헌법 12조 3항과 16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치판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정면 위반된다”, “헌법 파괴행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헌법 공부를 다시 해봐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난데없는 ‘헌법 싸움’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50조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데, ‘헌법 논쟁’인 것이다.
그래도 10년 전의 ‘헌법 다툼’의 경우 명분만큼은 ‘경제’였다. 지금은 경제와는 거리가 먼 ‘검찰’이 이슈다. ‘용산 집무실’에 이어 ‘검수완박’에 시간을 빼앗기다보면 경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이렇게 충돌을 하다보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관심은 ‘헌법’이 아니라 ‘민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고,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들은 먹고살기가 갈수록 껄끄러워지는데 ‘헌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