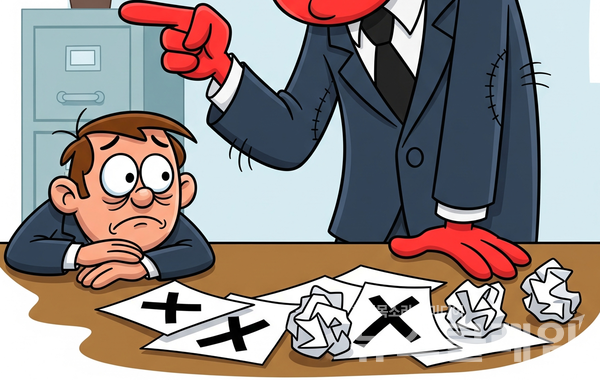
[뉴스클레임]
발음은 비슷하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잗다’와 ‘잦다’가 대표적인 예다. 두 단어는 겉으로 보면 철자 하나 차이지만, 쓰임새와 의미에서 뚜렷한 구분이 필요하다.
‘잗다’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나 양이 많지 않다’ 또는 ‘숱이 드물다’는 뜻을 가진다.
이 단어는 현대 표준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옛말에 가깝다. 고전 문학 작품이나 방언 속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일상 대화나 글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옛 시문에서 “이 고을 인심은 잗아 모이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람 수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잦다’는 오늘날에도 널리 쓰인다. 뜻은 ‘횟수나 빈도가 많다’로, 비나 사건·현상 등이 자주 일어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올여름은 비가 잦아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요즘 실수가 잦다”와 같이 쓴다. 여기서 ‘잦다’는 빈도가 높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다.
문제는 두 단어가 발음이 거의 같아 구어에서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미가 분명해야 하는 문장에서도 ‘잗다’를 써야 할 자리나 맥락에서 ‘잦다’를 쓰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잦다’ 대신 ‘잗다’로 표기하는 잘못도 나타난다.
특히 문학 작품을 인용하거나 지역 방언 표현을 다룰 때, 원문 표기를 무심코 ‘잦다’로 바꾸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주요기사
강민기 기자
79422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