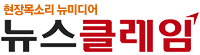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뉴스클레임]
건설 현장에서 매일같이 노동자들이 추락하고 깔리고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도 포스코이앤씨 사례를 통해 봤듯, 일부 건설사와 일부 언론은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뻔뻔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곧 “사람 죽어나가는 현장을 그대로 두자, 그래야 우리 돈벌이가 된다”는 선언이다. 참담하지 않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정곡을 찔렀다. 사람을 죽여 가며 겨우 유지되는 경기를 경기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불법·비인권적 현장을 묵인한 채 지탱되는 이윤이라면, 그것은 성장의 탈을 쓴 범죄일 뿐이다.
해마다 수백 명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반드시 막을 수 있는 죽음이다. 안전모와 안전망, 교육과 관리, 투자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비용조차 ‘경쟁력 약화’라는 미명 아래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 노동자를 숫자로, 생명을 원가 절감 항목으로 취급하는 태도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산업 안의 고질적 반(反)문명성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책임을 국가의 안전 단속에 돌린다는 것이다. 안전 점검을 강화하면 건설 경기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법을 지키면 장사가 안 된다는 딱 그 수준의 궤변이다. 다시 묻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죽음을 합리적 비용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의 책무는 분명하다. 면허 취소도 불사하며 생명을 중시하는 산업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 건설사가 저항한다면 그것은 곧 ‘사람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이익을 챙기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가 이를 용납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수한 죽음을 사회적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떠안게 될 것이다.
사람은 비용이 아니다. 목숨 위에서 돌아가는 경기는 거품이며, 범죄다. 건설업계는 더 이상 억지와 변명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확실히 말해야 한다.
"사람을 죽여 쌓은 건설 경기는, 경기의 이름조차 가질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