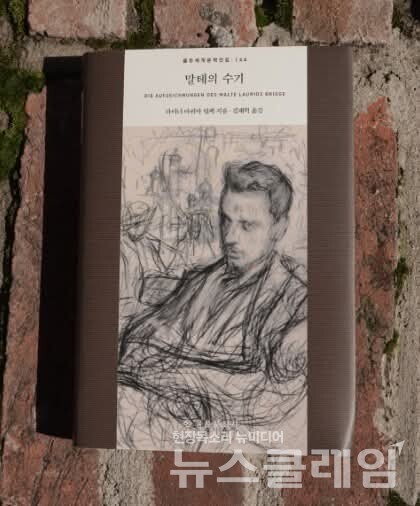
[뉴스클레임]
릴케는 말테의 입을 통해 ‘나는 보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다. 1875년 프라하에서 태어난 릴케는 로댕의 비서가 되어 세잔의 그림을 통해 보는 법을 배웠다. 세잔의 고집스러운 필체가 남긴 색면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 사물을 새롭게 보여주는 가를 깨달았다. 그는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죽은 화가의 눈을 통해 사물을 생생하게 보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사람은 호수가 하늘을 비추는 방법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다. 호수는 거울처럼 반영할 뿐 능동적으로 보지 못한다. 거울은, 아기가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듯, 볼록거울이 되든가 오목거울이 되면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정확하게 그리려고 째려보는 화가가 그린 그림과 휘둥그런 눈으로 보고그린 그림은 결과가 같을 수가 없다.
릴케는 자신보다 열네살이나 나이가 많은 루 살로메와 사랑을 하며 듣는 법을 배웠다. 살로메는 '레네 카를 빌헬름 요한 요제프 마리아 릴케' 라는 지루한 이름대신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라이너Rainer는 Reiner 즉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므로 릴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1927년 백혈병으로 죽은 릴케는 스위스의 묘지에 세워질 자신의 비석에 새겨질 글을 이렇게 썼다.
장미, 오 순수한 모순, 욕망,
이렇게도 많은 (관)뚜껑 아래 아무도 잠을 못 이룬다.
이 귀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미꽃 봉오리는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한국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 호수처럼 멍한 눈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학교시절 반공도덕 선생은 썩은 동태눈깔!이라고 호통을 쳤다. 그는 졸고 있는 우리들을 일깨워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가르치려고 박달나무로 깎은 드럼대를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다.
한번은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드럼대를 피하려던 한 아이의 귀가 찢어지기도 했다. 그때 허공을 가르는 드럼대가 우는 소리를 나는 잊지 못한다. 우리들의 까까머리는 그에게 동네북이었다. 이념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던 그는 반공투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