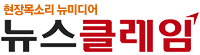올해는 증권시장 개방 30년이다. 꼭 30년 전인 지난 1992년, 외국인투자자에게 ‘직접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증권업계는 증시 개방을 앞두고 이른바 ‘선진투자기법’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투자를 ‘호재’로 받아들였다.
그래서인지, 증권관계기관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어떤 증권회사는 매매수수료를 깎아줄 테니 우리하고만 거래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그들의 ‘투자성향’을 전망하기도 했다. 결론은 ‘대형 우량주’였다. 자동차업종은 현대자동차, 전자업종은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렇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주식 따위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들이 사들인 주식은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은 주식이었다. 소위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이었다.
그 바람에 이들 종목의 가격이 곧바로 치솟았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덩달아 사들이고 있었다. ‘뇌동매매’였다. 그러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사들였던 주식을 처분, 차익을 챙겼다. 국내 투자자들은 번번이 ‘상투’를 잡아야 했다.
증권업계의 예상이 빗나간 것은 더 있었다. 그들은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에 치중했다.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그랬다가 팔아치우고 다른 주식에 손을 댔다. ‘단타매매’였다.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이 초기에 들여온 자금은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상장주식 시가총액 70조 원과 비교하면 ‘푼돈’이었다. 그들은 그 얼마 되지 않는 ‘장사 밑천’으로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었다. 그게 ‘선진 투자기법’이었던 셈이다.
이랬던 외국인투자자들이 증시 개방 30년인 올해는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고 있다. 1분기 동안 처분한 주식이 9조1230억 원어치에 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1월 1조6770억 원⟶ 2월 2조5000억 원⟶ 3월 4조8660억 원으로 계속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자금의 이 같은 이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올해 6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금리의 인상폭도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물가 불안과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환율이 뛰고, 그럴 경우 환차손 우려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