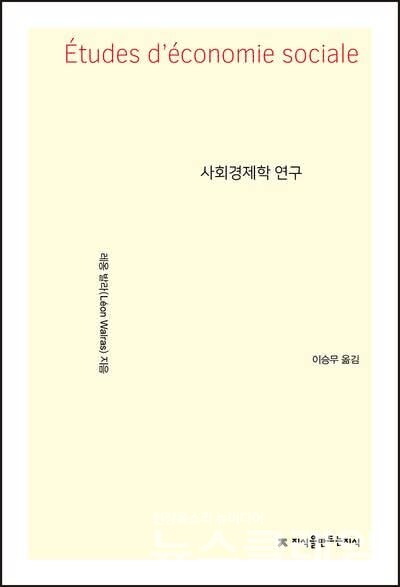
[뉴스클레임]
맑스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이지만 그의 노동가치설은 언뜻 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이 쓸데 없는 일에 투입될 때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로잔학파의 창시자이자 ‘경제학자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레옹 발라(Leon Walras)는 희소성을 가치의 원천으로 보는 아버지 오규스트 발라의 이론을 바탕으로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을 국가가 소유하고, 이것을 경제주체에 임대하는 대신, 세금을 폐지하자’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토지와 자원을 임대한 경제주체들은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성과의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축적된 자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여 세금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자나 자본가가 되기 위해 저축할 수 있을) 임금의 일부를 조세로 빼앗기는 노동자를 나는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릅니다..그러나 노예제와 농노제가 부당하다면 노동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떼가는 일도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ㅡ레옹 발라 <사회경제학 연구> 이승무 옮김, 226 쪽
사회적 부의 공평한 분배가 경제학의 목적이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경제학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학은 수학적 논증이 가능할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경제는 세가지의 시장 즉 제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기구에 의하여 개별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개별시장사이의 상호의존에 의해 전체경제에 균형이 생긴다는 ‘일반균형 이론’을 레옹 발라는 대담하게 제시한다.
‘일반균형에 이른 경제상태에서 기업가는 이윤도 손실도 보지 않는다. 그는 자기노동의 대가만을 보수로 받을 뿐이다. 일반균형의 상태에서 기업가가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신격화된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는 '공공 과 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공기업과 사기업의 공존을 보장하고, 토지 국유화와 토지세, 자본세 중심의 국가 재정을 강조한 혼합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을 부르짖는 밀턴 프리드만의 후예들이 주도하는 한국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빨갱이소리를 듣겠지만, 발라의 일반균형이론 자체는 경제공학적 기초를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기사
- LG전자-AI안전연구소, '글로벌 AI 규제 대응 협력' MOU
- 우원식 국회의장 "투표는 힘이 세다… 소중한 한 표 행사"
- 이준석 "대선 당당히 완주, 국민 손으로 마침표 찍어줄 시간"
-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서초구서 투표
- 21대 대선 오전 10시 투표율 13.5%… 대구 17% 전국 최고
- 이재명 "투표는 대한민국 미래 여는 열쇠" 김문수 "자유민주주의 지킬 기회"
- 21대 대선 본투표 시작… 자정쯤 당선인 윤곽
- 대선 오후 4시 투표율 71.5%… 전남 71.1% 최고·제주 68.1% 최저
- 권성동 "투표장에 나와 대한민국 미래 지켜주시길"
- 선관위 “투표관리관 미리 도장 찍는 건 문제 없어"
- 21대 대선 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1위… 김문수 39.3%·이준석 7.7%
- 홍준표 "잡동사니들 3년간 분탕질 치다가 이꼴"
- 전국 개표율 36%… 지상파 방송 3사 "이재명 당선 유력"
- [속보] 지상파 3사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 확실"
- [속보] 이재명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 다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