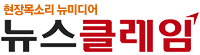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뉴스클레임] 마취 기술이 신통치 못했던 19세기 초에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술을 ‘왕창’ 마시도록 했다. 또는 아편을 사용하기도 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자가 수술 도중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발버둥이라도 치면 야단날 수 있었다. 수술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다. 환자를 움직일 수 없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으로도 안심할 수 없어서 건장한 조수들이 환자의 사지를 꽉 붙들고 있거나 누르도록 했다.
그래도 환자의 ‘입’까지 ‘제어’하기는 힘들었다. 환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조수들이 겁을 먹고 모두 달아나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는 별 수 없이 의사의 아내까지 동원해서 환자의 가슴을 누르기도 했다.
외과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을 잃지 않는 침착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를 위해 외과의사는 자신의 귀에 귀마개를 했다. 환자의 비명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틀어막은 것이다.
이런 식이었으니,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수술을 끝내야 좋았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정확하고 빠르게 수술을 끝내주는 것이었다. 물론 의사도 덜 힘들 수 있을 것이었다.
수술의 종류는 대부분 사지의 절단술이었는데, 얼마나 빨리 수술을 해치우는지 여부가 의사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1824년, 어떤 의사는 고관절부위를 절단하는 데 20분이 걸렸다고 했다. 10년 후 다른 의사는 같은 수술을 불과 90초 만에 끝내기도 했다.
수술을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는 시간 절약이 필수였다. 어떤 의사는 두 손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용 칼을 입에 물고 있을 정도였다.
당시 외과의사는 인기 높은 배우와 같은 존재였다. 수술이 있는 날은 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관객이 ‘원형 강의실’로 몰려들었다.
나무로 만든 수술대에는 출혈을 흡수하기 위한 톱밥이 깔렸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가죽 앞치마를 두른 외과의사가 자신의 수술도구를 들고 입장할 때면 관중은 박수로 환영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에게 박수를 보낼 일이 적어지고 있다.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응급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는 잊을 만하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근무할 의사는 연봉을 대폭 올려줘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더욱 그렇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외과 전문의 46명 모집 공고를 냈는데, 10번이나 실패하고 있었다. 11번째 공고 끝에 목표보다 한 명 많은 47명을 어렵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인기 진료과목’인 내과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82명을 모집했지만 9번 모집 공고를 하고도 72명밖에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응급의학과’는 24명을 모집했는데, 10명을 채용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진료과별 전문의 지원 및 모집 현황’이라는 자료다.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학술대회’에 전문의들이 몰려 성황이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런데도 의대 정원 확대는 ‘결사반대’다. ‘밥그릇’은 나누기가 싫기 때문일 것이다.
주요기사
- [오늘 날씨] 외출 시 우산 필수,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낮 최고 29도
- 삼성 갤럭시 워치 '불규칙 심장박동 알림기능', 식약처 허가
- 현대차 아이오닉6·아이오닉5, '캐나다 올해의 친환경차' 수상
- GS리테일, 부산시와 '지역 브랜드 가치 확산' 업무협약 체결
- ‘KB 솔버톤 대회’ 인기… 본선 경쟁률 21.1:1 기록
- CJ프레시웨이, 식자재 유통 산업 전문가 양성
-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보
- LG전자,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 금호타이어, 유럽시장 공략 강화
- KB국민은행, 아시안뱅커지 선정 '아시아·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 "AMD 소프트웨어 부문, 아직 시장의 확신 주기 어려워"
- "190만원 받아 아이 낳기 힘들다"[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
- '공무원 생존권 보장' 위한 우중투쟁
- 신한베트남은행,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과 업무협약
- 베트남우리은행, 삼성화재 베트남법인과 재산보험 협약 체결
- "사과 없는 정부…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 "미등록 이주민 체류안정화하라"[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 오비맥주, 음주운전 근절 노력
- "실패한 단속추방, 미등록 이주민 대한 반인권적 정책 그만"[생생발언]
- 소리없이 죽는 이들… 미등록이주민 체류 안정화 목소리[영상]
-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마무리 후 경찰 출석"[생생발언]
- '최대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신청 첫날… 가입조건은?
-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 남은건 尹정권 퇴진 투쟁"[영상]
- 'SR 부당특혜 중단, 고속철도 통합'[전국철도노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 유가족 면담 대신 경찰 기동대 요청… 민주당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 [사설] 국고보조금 노린 세금도둑, 강력 처벌해야
-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분할 정책, 명백히 실패"[생생발언]
- 대통령실 앞까지 이어진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