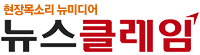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뉴스클레임]
KT의 신뢰가 무너진 시간은 해킹 당한 순간이 아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아무 것도 모르는 척, 책임을 피해본 순간부터였다. 서버가 뚫렸다는 사실을 안 지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했다. '24시간 이내 신고'라는 법조항은 현실에서 외면당했다. KT가 늦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순간, 고객은 이미 등을 돌렸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곧장 알리지 않는다. 오늘도 '축소', '분산', '오류' 같은 말로 설명을 대신한다. 처음엔 개인정보 유출 없다고 했다가, 나중엔 수천, 수만 명 정보가 나갔다고 인정한다. 해명이 늦을수록 믿음은 차가워진다. “서버 침해를 사흘째 몰랐다”고, “내부 부서가 따로 움직였다”고 둘러대지만, 책임지는 목소리 하나 들리질 않는다.
이번에는 전형적으로 늑장 신고와 은폐 논란이 겹쳤다. 고객센터엔 문의가 쏟아지는데, 사내 브리핑장에선 안이한 해명이 반복된다.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KT의 사과는 뒷북이고 책임은 회피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KT, 왜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고객이 원하는 건 ‘신속하고 정직한 안내’인데, 기업의 현실은 멀다.
해킹은 기술이 막는다. 하지만 거짓말과 늦장 대응은 기업의 문화와 태도가 막는다. KT의 대응에서 고객은 두려움을 느낀다. “나의 정보는 안전한가?” “위기를 숨기고 지나치지는 않는가?” 물어도 답은 없다. 보안장벽은 높아졌지만, 기업과 사회의 신뢰는 더 낮아졌다.
KT는 기술보다 신뢰를 잃었다. 이번 사태에서 고객이 느낀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