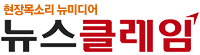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뉴스클레임=박상률 작가] 독일 작가 안톤 슈낙은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제목으로 하여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여럿 들었다. 그 제목을 약간 비틀면 시방 많은 이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상태이리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울하게 한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란다. 전쟁은 일상을 못 누리게 하니까... 나로선 두 나라 사이의 전쟁 명분을 못 찾겠다. 전쟁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좋은 전쟁은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푸틴은 악마이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바보이다. 어떡하든 전쟁이 안 나게 했어야 했는데...
러시아가 공격할 만했다는 말이나 우크라이나가 당해도 싸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기를... 전쟁엔 명분도 필요 없고 당해도 싼 이유도 없다. 전쟁은 무조건 안 일어나야 하는 것!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며 한반도의 위험성을 고려않고 강경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며 전쟁을 마치 ‘게임’이나 ‘오락’ 정도로 여기는 종자들의 언행을 접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공정하지 않은 윤가 무리가 공정, 공정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접수한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지난 1980년대에 군사반란 주동자 전머시기가 각종 공문서 기안 용지 머리에 쓰게 한 ‘정직 질서 창조’를 보는 듯하며 자기네들 둥지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 하면서 ‘정의’를 강조했다. 그때 정의로웠는가?
검찰 조직이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는 행태도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총장에서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표? 그 전에 독재에 맞서 부당한 수사에 맞서 떼거리로 사표를 쓴 적이 있는가? 사표는 오로지 밥그릇 지킬 때만 필요한가? 앞뒤 안 맞는 검사들의 행태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검사들 밥그릇 지키는 걸 보고만 있는 國害議員(국해의원)들도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특히 민주당 국해의원들. 그들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정도에서만 움직였나? 하긴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기만 나중에 국해의원 또 할 수 있으면 그만이니까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더라. 이것도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인권변호사 한승헌 선생이(변호사는 본디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므로 ‘인권’변호사라는 말은 적당치 않다고 늘 말씀하신 분) 세상을 떴다. 평생 웃을 일이 없는 환경에서 사셨지만 변론이나 글에서 유머를 잃지 않은 분. 시국 사건 변론은 다른 변호사들이 잘 안 맡으려 하기에 시국 사건을 많이 맡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외설 시비 사건도 맡아야 했다.
마광수 교수가 ‘즐거운 사라’,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등을 펴내 ‘음란문서작성죄’로 구속되었을 때도 촌철 살인 같은 유머를 구사하며 변론하신 분.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란의 첫째 요건은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던데,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부모님의 성적 흥분에 따라 태어났으니 범죄의 산물입니다. 성적 흥분이 죄이면 제약회사가 성적 만족을 일으키는 약의 제조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국가는 그걸 왜 허용하지요?’라고 물었다.
나는 우울감을 털어버리려고 애써 바쁘게 산다. 어제까지 한 주 내내 강의, 강연, 심사를 사양하지 않고 했으며, 청탁 글도 사양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우울감이 가시지 않아 오늘 새벽엔 그간 못 읽은 시집을 읽었다.
나해철 시인의 ‘물방울에서 신시까지(솔 펴냄)’. 나해철 시인은 80년대에 내가 충격적으로 읽은 ‘오월시’ 동인. 생업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시를 씀으로써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 더 하고 있다.
‘...죽음 속에 있는 것도 같고/펄펄 살아 있는 것도 같은/ 아직은 태어나기 전인 것도 같으나/진즉 벌써 새로운 생명까지를 이태하고 있는 것도 같은...’ 구절로 긴 장편 서사시의 문을 연다.
이를 보면서 그가 세월호 수장 사건이 일어나자 슬픔을 못 이겨 날마다 시 한 편씩 304 편을 써서 페이스북에 소개한 뒤 책으로 펴낸 ‘영원한 죄 영원한 슬픔(문학과행동 펴냄)’에 수록 된 시 한 편이 떠오른다.
‘종이 운다//가운데가 비어서 운다//북이 운다//가운데가 비어서 운다/(...)//네 엄마가 운다//가운데가 비어서 운다//나도 운다//내 가운데에 살아있는/너를 보면서 운다’
-‘운다는 것’ 일부
다음으로 집어든 건 김완 시인의 시집 ‘지상의 말들(천연의 시작 펴냄)’. 나해철 시인의 의대 후배인 의사 시인. 내가 아는 전남대 의대 출신 시인 가운데에 가장 늦게 인사를 튼 분. 가장 오래 된 분은 나해철 시인이고, 그 다음으론 김연종 시인(이 분은 내가 편집위원하던 문예지에 시를 투고해서 등단했기에...). 김완 시인은 광주 5.18 행사 때나 서울에서 작가회의 행사 때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시집을 펼치니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시가 ‘관매초등학교’이다. 80년대에 선친이 근무하신 학교라서...
‘낡은 경운기가 누워 있는 학교로 들어간다/쪽빛 바다와 녹색 함성이 시끌벅적했을/폐교 안에는 누군가 살고 있을 것 같다/(...)/바람도 조는 한여름 오후 교실을 빠져나온/햇살 경로당 뜨락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관매초등학교’ 부분
문동만 시인의 ‘설운 일 덜 생각하고(아시아 펴냄)’는 시인의 마음이 넉넉해서 좋다. 그는 시집 끝에 붙어 있는 산문에서 ‘나는 평평한 게 좋고 너그럽고 낙관적인 마음들이, 스며가는 느릿느릿한 물 같은 마음들이 좋다’고 썼다. 그래서 그의 시엔 동물도 사람 못지않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섬을 갔다 오면 섬만 생각나는 게 주인도 한참을 비운 외딴집/홀로 지키는 늙은 개가 생각 나네/(...)/고동소리에 귀를 세우다/이내 동백나무 그늘 속으로 몸을 눕히는/ 해풍에 말라가는 눈 그렁그렁한//늙은 개 같은 섬을 떠날 때//(...)
-‘늙은 개 같은’ 일부
원종태 시인의 ‘멸종위기종(푸른사상 펴냄)’을 집어든 순간, ‘무엇보다 사람부터 멸종 위기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거제 바닷가에 살면서 바다의 숨탄것, 뭍의 숨탄 것들의 생명 살리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그의 시를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 아프거나 죽음에 이르면 시인도 같이 아파한다.
‘잘린 나무의 나이테를 보았다/나이테를 세다가 나이가 같아/나무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갔다/동심원이 멀리 멀리 번졌다//(...)/바다가 방파제를 부수고/매립지 위의 도시를 침수시키는 것은/자기 몸의 기억 때문이다//(...)’
-‘환상통’ 부분
‘강아지 눈과 내 눈을 맞추면/강아지 눈 속에 내가 보입니다/내 눈 속에 강아지가 보입니다 //달랑게 눈을 들여다 보면/달랑게 눈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내 눈 속에 달랑게가 들어옵니다//(...)
-‘눈부처’ 부분
김자흔 시인의 시엔 고양이가 많이 나온다. 이번 시집 전에 펴낸 시집에도 그랬는데 이번 시집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가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며 고양이를 통해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그의 시를 읽다보면 사람이 고양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사람을 성숙시키고 있는 느낌.
늦깎이 대학생으로 내 과목(희곡)을 수강하기도 했던 학생이었지만 고양이가 시적 대상이 되고 객관적 상관물로 고양이를 늘 등장 시키는 줄은 시집을 보고서야 알았다. 시집 ‘하염없이 낮잠(시인동네 펴냄)’의 표제작인 ‘하염없이 낮잠’에도 역시 고양이가 등장한다.
‘고양인 주인 얼굴 따윈 곧바로 잊어버리지/그것이 고양이의 장점이라면 장점,//(...)//사실 고양이는 식빵을 구우면서/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지//오늘은 오수를 되감는 시간,//(...)
-‘하염없이 낮잠’ 부분
김흥기 시인은 ‘첫눈이 내게 왔을 때(개미 펴냄)’의 ‘첫눈’이라는 시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다.
‘매년/첫눈이 올 때마다/왜 나는 단 한번도/그 오랜 세월 동안/첫눈들이 내게 왔을 때//왜 나는’내 인생의 끝눈을/단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첫눈’ 전부
그런 그이기에 ‘국회의사당’이라는 시에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를 재미있게 꾸짖는다.
찌거덕 찌거덕/여의도 한복판에도/가위 치며 고물 사는 엿장수가 있다네//(...)//고물 삽니다.빈 병이나 헌 냄비 삽니다//국회의사당 삽니다
-‘국회의사당’ 부분
최지인의 시집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창비 펴냄)’를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그는 젊은 시인이다. 첫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에서도 그의 성정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이번 시집에선 더 잘 읽힌다. 그는 자신의 시 쓰기의 바탕을 ‘현실’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리얼리스트이다. 하지만 현실의 아픔을 구호가 아니라, 영리하게 형상화해 낼 줄 안다.
‘(...)마흔이 되던 해에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센터 민원 대기실에 앉아 손에 쥔 번호가 불리길 기다리는 선배에게 지나온 삶은 행복이었을까 절망이었을까//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인간은 왜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 걸까//함께 일했던 동료 두 명은 쓸모 없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대체할 수 있는 것들//포개져 있는/무해한 사람들//(...)
-;살과 뼈’ 부분
시를 읽는 동안은 덜 우울했다. 시를 보는 순간 어느 시집이든 ‘공히’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생겨났다. 웃자 웃자, 웃을 일 없어도 웃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