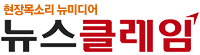사라져버린 황새를 위한 레퀴엠

[뉴스클레임]
황새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창밖의 동정을 살폈다. 분명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들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웅얼거리는 소리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들려오는 소리가 명확지는 않지만, 사람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굴까?‘
창문을 열고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면 될 터인데, 나는 창문을 차마 열 용기가 없었다. 대신 속으로 오돌오돌 떨면서 창문이 밝아올 때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대부분 안 좋았던 지난날의 기억들이었다. 안 좋은 기억들은 좋은 기억들을 내몰기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창문이 밝아오자 나는 겨우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다. 가관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얼굴은 밤사이에 푹 삶아진 늙은 호박잎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날따라 오전에 약속이 잡혀 있었다. 외출준비를 하면서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시는 오전에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사실 다짐은 무의미했다. 얼마 전에도 나는 분명 똑같은 다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나는 같은 다짐을 했었다. 그러고 보니 내 삶은 지키지 못할 다짐의 반복이었다. 끊어내지 못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니 못내 서글펐다.
기껏 다짐도 지키지 못할 하류 인생이라는 생각에 괜히 눈물이 났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집을 나서면서 내방이 속한 창밖을 쳐다보았다. 특이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의 소리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었다. 굳이 소리의 자취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집 구조를 살펴보고 싶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날 오후, 우이동 골짜기로 들어온 지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가 머무는 숙소에서 산책로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머금을 수 있는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먹거리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특히 삼겹살집을 눈여겨본 것은 도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애매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내게 도반이 있다는 것은 진정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참 어처구니없었다. 그토록 혼자만의 공간을 원했음에도 불구, 막상 그 공간이 주어지니까. 당장 게으름부터 피우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게으름을 얘기하기 전에 혼자만의 공간확보는 내 삶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사무실 한쪽에 나만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놓은 적은 있었다. 그런데 누옥이지만 부동산 서류에 내 이름이 꽂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애당초 감개무량할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나는 무엇에 쫓기듯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토끼잠을 자다가 곧바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기를 반복해왔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사는 삶은, 저주받은 그리고 의식이 뒤죽박죽된 나의 삶과 정말 닮았다.
그동안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 짐이랄 것은 없었다. 책이 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를 오기 전 고물상에 차로 책을 두 번이나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이삿짐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뿐만 아니라 창고로 쓸 공간마저 점거한 책들을 대충 풀어 넣고 정리조차 못 하고 있었다.
책을 정리하려고 책상에 책을 꽂아 넣어보기는 했었다. 그러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책을 분야별로 정리하기 전에, 버려야 할 책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깜박 잠이 들었다. 가을비치고는 요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잠이 깬 것은 한밤중이었다. 또다시 전날 밤처럼 창문 밖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열기만 하면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터인데,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만 내내 죽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새벽이 다가올 무렵,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누가 밤새 창문을 두들기는 것일까?”
어수선한 시간이 지나고, 그날도 나는 타다만 재가 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연이틀 잠을 자지 못한 나의 얼굴은 온통 하얀색으로 범벅이 된 귀신이 되어있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나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빛부터 고장 난, 두려움을 뒤집어쓴 얼굴이었다. 두려움과 안일함 사이, 두려움과 불신 사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 두려움과 미련 사이를 방황하는 그동안의 세월이 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얼굴이었다.
사실 이사를 오기 전에, 미리 책을 과감히 버렸어야 했다. 뭔 미련이 남아 있는지 난 책을 버리는 데 주저했다. 지금 당장 내게 쓸모없는 책들은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아니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다.
장애물은 책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미련이 동반된 안일한 태도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애정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애매한 애정 말이다. 나는 항상 애매한 것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놓지 못하고 있다. 상처투성이의 삶은 그 때문에 비롯된 것을 알면서도 애매한 것들과 단절을 주저한다. 애매한 것을 끊어내지 않고 질질 끌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나는 삶이 두렵다. 특히 한밤중이 되면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운다. 다행히 낮에는 씩씩한 척하면서 삘 삘 돌아다니지만, 혼자만의 밤이 되면 나는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덮쳐 온다.
그러다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밤을 보내다가 갑자기 황새가 떠올랐다. 문득 내가 사는 법과 황새의 사는 법이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텃새인 황새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사냥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황새는 부리로 이것 저곳을 찔러가면서 사냥을 한다. 그것도 무작위로 찔러대는 것이다. 찔러대는 횟수는 5분당 10회 정도, 그중 1회 정도 먹이를 낚으면 성공이다. 한 마리 먹이를 잡기 위해 9번은 허탕 치는 셈이다. 이것도 잘 될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황새의 대충 사냥법과 두려움에 휩싸여 애매하게 대충 사는 나의 삶과의 차이를 도통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도 황새처럼 이 사회에서 흔적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제는 사라지는 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일은 아니다. 가져서도 안 된다. 그날 밤 창문을 두들긴 것은 혹시 황새일지 모른다는 상상이 들었다. 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변했다. 황새는 울지 못한다. 대신 부리를 부딪쳐서 의사소통하고 짝을 찾을 따름이다.
“황새는 왜 창문을 두들겼을까?”
주요기사
-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전라권 가끔 비… 아침 최저기온 7~16도, 낮 최고 15~22도
- [잡채기 칼럼] 임기반환점, 낙관론 비관론
- [식사합시다] 일품생고기
- SPC그룹, 몽골 정부·기업에 해외진출 전략 전수
- 금호타이어, '희망의 공부방' 완공
- 현대자동차, 이동형 수소충전소 준공
- HDC현대산업개발,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수주
- LG유플러스 STUDIO X+U, '금수저' 서바이벌 예능 공개
- 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 적용
- 롯데홈쇼핑, 중동서 K-브랜드 860억원 수출 상담 성과
-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 '게임잼' 성황
- JW중외제약 ‘하이-마미’ 보육기, 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 KB국민은행, 청소년 전용 금융 플랫폼 오픈
- NS홈쇼핑, ‘수원뷰티페스타 2024’ 참가
- 대신증권, 강남 지역에 대형금융센터 오픈
- "혜택 더하고 불편함 줄이고"… 현대면세점, 새 BI 공개
- 롯데웰푸드, 미국 뉴욕에 대형 옥외 광고 전개
- 오비맥주, 맥아포대 업사이클링 외투 보관 가방 배포
- NH농협은행X변우석, '퇴직연금’ 광고캠페인 공개
- BMW 코리아 미래재단, ‘분교 초청 데이’ 종료
- 웅진휴캄, 영유아 화장품 시장 진출
-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일반게임 프론티어 부문 수상
- 코스피, 오름세로 장 출발…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 "고객 니즈 맞춰요"… 신한은행, '신한 홈뱅크' 개편
- SPC 파리바게뜨 CJ온스타일 롯데마트 外(유통家 이모저모)
- '뭉치면 더 새롭다'… 경계 허무는 이색 콜라보
- 넥슨, ‘환세취호전 온라인’ CBT 실시
- 우리금융그룹, 에너지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 尹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민주노총 "자리에서 내려오길"
- 효성중공업-덴마크 오스테드,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 체결
- 민주당 "윤석열 시정연설 불참,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 없어"
- [실적] 지누스, 3분기 영업이익은 119억원
- "대통령직에서 손떼고 퇴진하라"[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선포]
- 국민의힘, 민주 '금투세 폐지' 결론에 "늦었지만 다행"
- "국민 55%, 감세정책 때문에 세수 결손 발생 공감"
- "尹정권 끌어내린다"… 첫 번째 퇴진 광장 선포
-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기술 수출 성과, '캔톤페어'서 재확인
- "소홀히 다뤄지는 대중교통 안전… 교통정책 감사해야"
- 노동시민사회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나서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삼성도 AI 물결 잘 타서 더 좋은 성과 낼 것"
- KB금융그룹, 특별한 문화 경험 선사
- [실적] 엔씨소프트, 3분기 매출 4019억원
- "죽음의 급식실 언제까지… 조리원 정원 확대 요구"
- 부산시민사회 "'공공의료 살리기’ 공동행동 돌입" 선포
- [실적] 동원그룹, 3분기 영업이익 1744억원
- 임영웅도 팬덤도 "베풀고 또 기부합니다"
- [클레임 만평]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