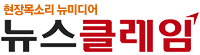[뉴스클레임]
'소름이 돋았다. 언젠가 암소의 혀가 핥고 지나간 적 있던 내 손등 위에 속삭이는 말처럼 은밀하면서 간지러운 것들이 돋아났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나는 외양간으로 가서 얼어붙은 두엄을 밖으로 치웠다. 술기운이 잦아들면서 차가워졌던 몸이 달아올랐다. 식은땀이 흘렀다. 소를 팔았지만 우리집은 여전히 가난했다. 내게 그 소가 대학 등록금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주무신다. 어머니는 맑은 물로 무쇠솥을 부시어내고 주인을 잃은 외양간으로는 사방에서 사나운 시선 같은 찬바람이 몰아친다. 쇠스랑을 쥘 자격이 없는 손아귀 가득 더운 땀이 배어난다. 아버지는 내게 물었다. 그래, 소설이라는 걸 쓸 테냐. 아버지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이래도 소설이라는 걸 쓸 테냐. 나는 고개를 저었는데 무엇을 부정하는 거였는 지는 아버지 역시 확신할 수 없었으리라. 쓰고 말고 할 게 있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으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제기랄, 소설은 이미 저 소가 다 써버린걸요. 세상이 들려준 이야기를 받아 적는 것만으로도 소설이 되는 비장하게 희극적인 삶을 삭제할 수 없는 나로서는 여전히, 문학은 소다.'
<마음을 다쳐 돌아가는 저녁> 22쪽
'문학은 마지막 희망이다. 문학이 무너지면 세계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문학과 비슷해보이는 것은 문학이 아니다. 문학만이 문학이다. 소설과 비슷해보이는 것은 소설이 아니다. 소설만이 소설이다. 소설을 규정할 수 없는데 소설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 아무도 소설을 규정할 수 없지만, 누구나 그게 소설임을 알아본다. 아, 이게 바로 소설이구나, 하며 나지막히 감탄하게 된다..' (작가의 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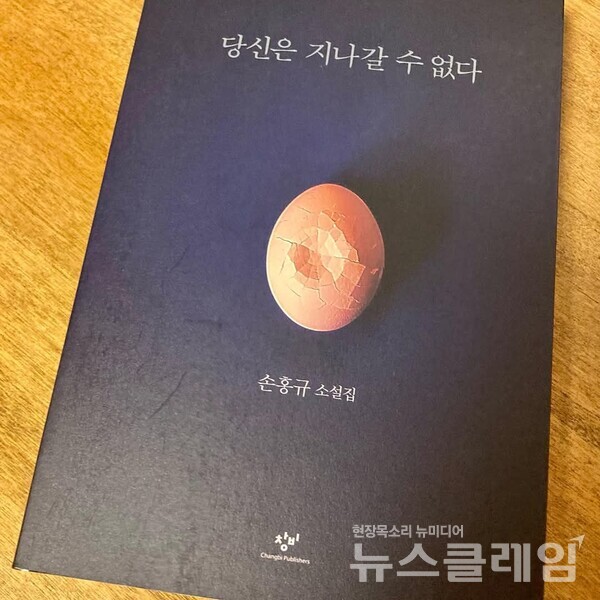
주요기사
- [오늘 날씨] 전국 가끔 구름 많고 전북북동부 한때 소나기… 아침 최저기온 9~15도, 낮 최고 20~27도
- 바디프랜드, '용천혈' 자극 마사지 장치 신기술 특허 취득
- 신한금융,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 LG전자, 데이터센터에 고효율 HVAC 솔루션 공급 확대
- 역대 최단 기록…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200만대 판매 돌파
- 하나금융그룹 "소득 절벽, 거주안정성 동시 해결"
- 현대차그룹, '제로원 3호 펀드' 설립
- LG유플러스, '유쓰 페스티벌' 마무리
- 한미약품 ‘에페거글루카곤’, 임상 2상 중간 분석 결과 발표
- 웅진씽크빅, 에듀테크 솔루션으로 글로벌 공략 가속
- 노스페이스, 'NBCI’ 아웃도어 부문 1위
- 삼양식품 '맵탱 후레시맵' 캠페인 마무리
- 경동나비엔, NBCI 가스보일러 부문 1위 선정
- GC녹십자의료재단-우주베키스탄 SEWPHC, 초청연수 및 업무 MOU 체결
- 풀무원-카카오메이커스,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ESG 경영기반 전략적 MOU
- 매드포갈릭 '대학생 레시피 공모전' 대상에 '된장 갈릭 크로켓'
- NH농협은행, 'IT×BIZ 원팀 워크숍' 개최
- BBQ 올리버스,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
- 한국맥도날드, 환아와 가족 위한 ‘따뜻한 발걸음'
- 하이트진로, ‘센텀맥주축제’ 공식 후원
- 동아제약, 어린이 키 성장 지원
- 시지메드텍, '올어버트먼트' 인수
- 교촌에프앤비, 프랜차이즈 성공 노하우 전파
- 넷마블 '레이븐2', ‘HK이노엔 헛개수·컨디션환’ 제휴
- 넥슨, kt wiz 프로야구단과 협업
- 미래에셋증권, 인출형 상품 라인업 확대
- 현대그린푸드, 쌀 소재 ‘메디푸드’ 개발
- "시프트업, 로컬·PC 플랫폼 성과 기대 이상"
- CJ제일제당 쿠팡 해태제과 外(유통家 이모저모)
- 롯데물산,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 프로젝트 실시
- 우리은행, 하계 체험형 인턴 모집
- CJ나눔재단, ‘CJ도너스캠프 운동회’ 개최
- '올리브영 페스타' 성료… K뷰티 산업 컨벤션 진화
- KT새노조 "계속되는 직원 사망… 토탈영업TF 즉각 해체"
- 유한양행,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공모
- 물때에 곰팡이까지… 비위생 '김치찌개' 제조 업체 적발
- 동국제약, ‘테카소사이드 카밍 라인’ GS25 론칭
- 우리금융그룹, ‘우리사이 2기’ 성과공유회 개최
-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 부문 1조 클럽 안착
- 청년·대학생·청소년 1000인 "'다시 만들 세계' 건설"
- 본인 도장으로 투표? 국힘 "가짜뉴스 유포 유감"
- 쿠팡, 박대준 단독대표 체제로
-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플레이엑스포 2025’ 참가
- 전장연 "이재명, 탈시설용어·권리 입법으로 보장해주길"
-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깨끗한 포용 금융 실천"
- 금속노조 "자회사 차별 중단… LG전자, 책임있게 교섭 나오길"
- 코웨이, 고객·임직원 초청 '홈런데이' 개최
- '우리는 왜 예외인가'[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 '시급 8220원'… 최저임금 제도서 배제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 [알쏭달쏭 우리말] 되뇌이다, 되니다
- 박지현, 임영웅·이찬원과 어깨 나란히
- [내일 날씨] 오후~저녁 강원내륙·산지 등 소나기, 곳곳 천둥·번개… 낮 최고기온 21~28도